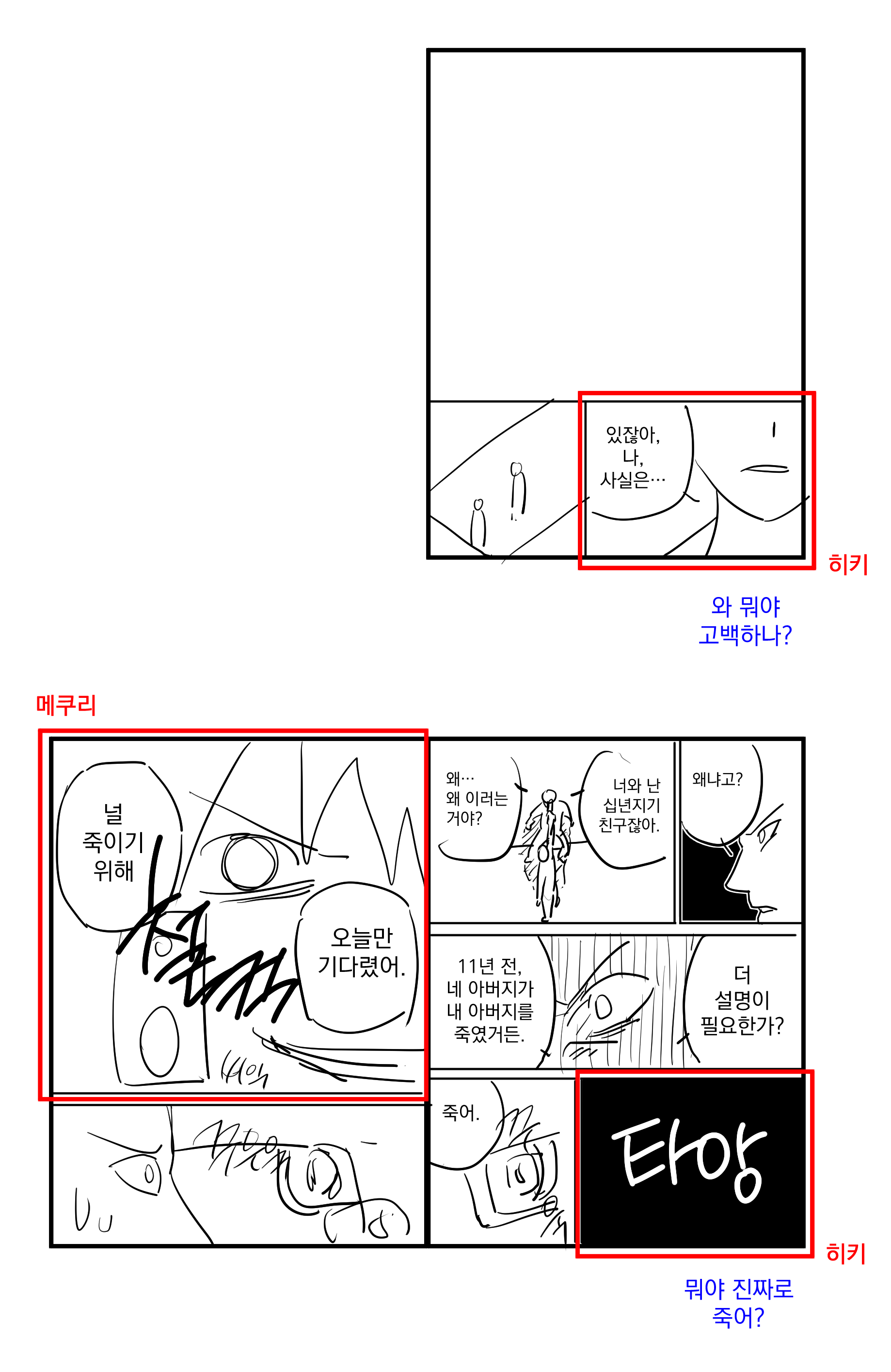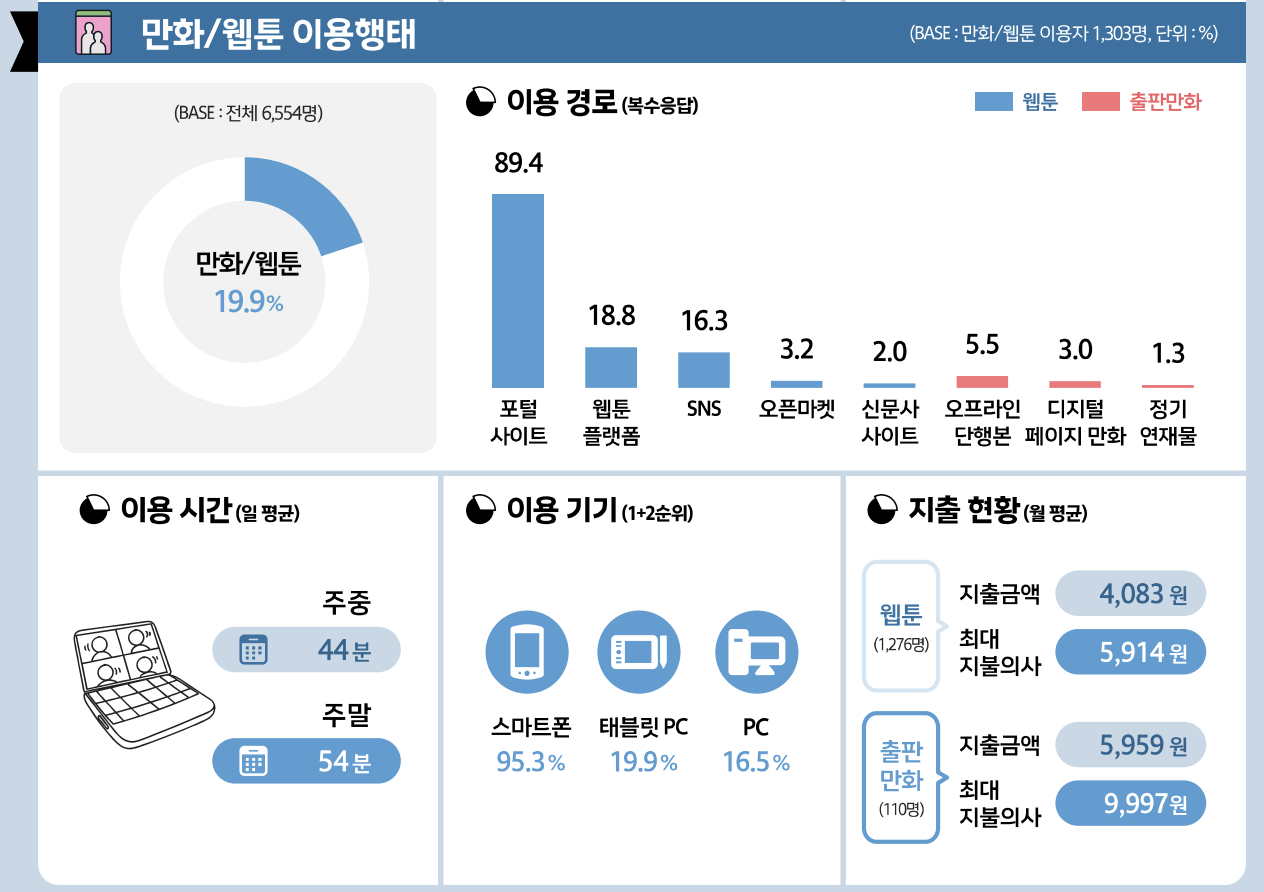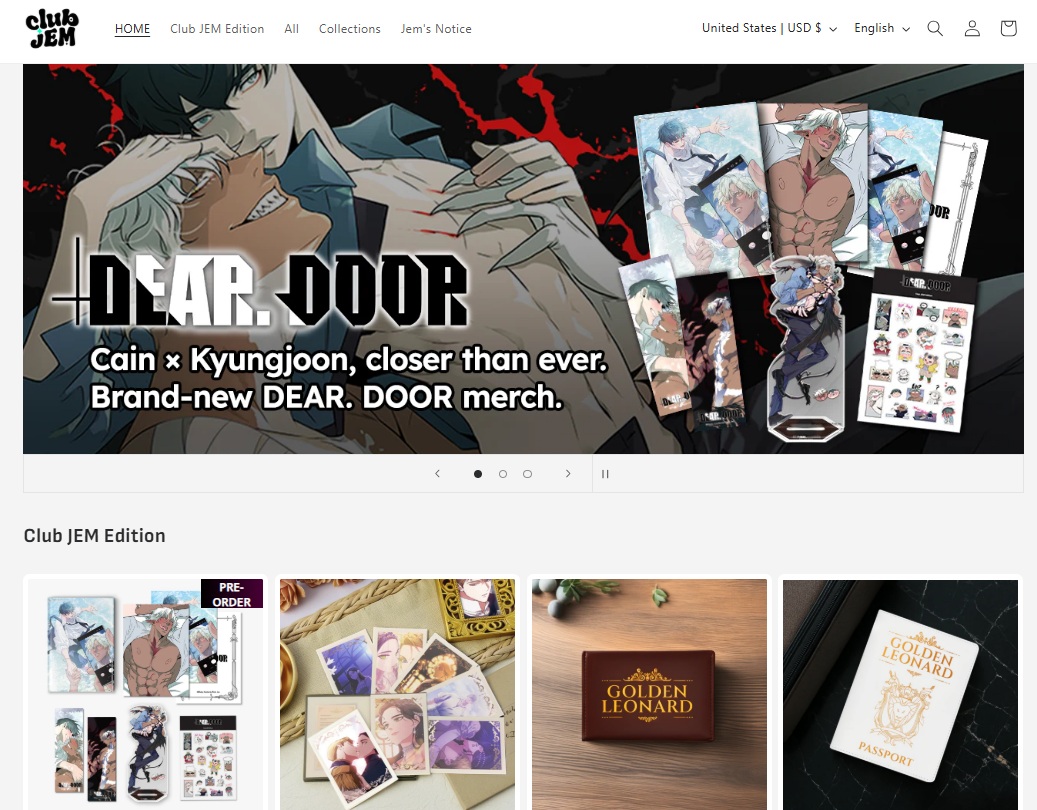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디터가 인생 처음으로 본 만화책 단행본은 <슬램덩크> 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 1995년쯤 되었을 겁니다. 9살 터울의 형이 쥐어 준 만화책을 들었던 꼬마는 알았을까요? 만화평론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걸. 물론 알았을리가 없죠. 그게 바로 저니까요. 아무튼, 에디터는 매년 <슬램덩크>를 한번은 읽습니다. 거의 모든 장면을 떠올리는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봤으니, 에디터에게 <슬램덩크>는 마스터피스의 기준이 됐습니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은 <슬램덩크>고, 가장 좋아하는 만화 속 인물은 신준섭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작품,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주관적이고 편향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위 '스포일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1) 고요하게, 스케치로 시작해서, 스케치로 끝나는.

첫 스틸 이미지가 공개되고 사람들은 우려를 보였습니다. 스틸컷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3D 렌더링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D 흑백 만화가 3D 모션그래픽으로 옮겨졌을 때 어색함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애니메이션이죠. 그런데 보고 난 감상은 '움직이는 만화'에 가깝습니다. 만화에서 독립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만화의 연장으로써의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극장에 앉아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만화의 연장선'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첫 시작은 스케치로 시작합니다.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북산 5인방을 한명한명 그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오면서 첫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작품의 마지막도 드리블하는 송태섭이 점점 흑백 만화의 그림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되죠. 비주얼로 이게 만화의 연장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만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덕목 중 하나인 효과음과 BGM을 비롯한 음향의 활용이 아주 억제되어 있다는 점이 '만화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후반부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모두가 화면을 한 순간이라도 더 담기 위해 완전히 몰입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때, 영화관 안에는 어떤 소리도 없이 화면만 움직입니다.
극장판이 만화와 다른 점은,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만화 속에 설치해 둔 'SD' 캐릭터들의 개그 컷입니다. 예를 들어 강백호의 '안면 슛'을 성공시키고 '역시 천재...?'라고 말하는 장면이나, 신현철을 블로킹하고 채치수와 하이파이브를 한 다음 손이 벌겋게 달아오른 장면과 같이 만화책에서는 한 컷이 오롯이 쓰인 장면이 영화관에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장면으로 지나갑니다. 감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팬에게 '재현'을 보여준다는 인상을 받았네요.
2) '다 아는' 장면, '아무도 몰랐던' 기억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북산의 전국대회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경기, 작품 속에서 등장한 마지막 경기인 최강, 산왕공고와의 경기를 다룹니다. 그러니 <슬램덩크>를 본 사람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고,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슬램덩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보면 엄청나게 불친절합니다.
등장인물 이름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팀 멤버들의 역사,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심지어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슬램덩크>를 31권까지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작품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슬램덩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작품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는 알죠?' 하고 치고 나가는 것. 이건 '장르적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등교하다가 트럭이 다가오면? 이세계로 가는구나 예상하게 되고, 검은 눈에 덩치가 크고 피부가 하얀 사람이면? 북부대공인 식이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만화 <슬램덩크>의 연장선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갑니다. 어차피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하되, 그 안에 우리만 몰랐던 기억을 넣습니다. 그게 <슬램덩크> 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송태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송태섭이죠. 같은 장면을 보는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산왕전이 송태섭의 시선에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대성공입니다. 적어도 일생의 작품으로 <슬램덩크>를 꼽는 에디터에게는요.
3) 오래된, 그래서 힘이 있는 테마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테마는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에디터가 꼽은 건 '소년에서 남자로'라는 테마입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도 철부지 문제아였지만 농구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송태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송태섭이 가진 삶의 흔적들을 설득력있게 보여줍니다. 특히 고향을 다시 찾은 송태섭의 장면은 꼭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 '소년에서 남자로'라는 테마는 꽤나 오래되었고, 아주 많은 변주가 있었습니다. 장르적 클리셰로 쓰이기도 하고, 노래 가사에도 종종 등장했었죠. 하지만 너무 많이 쓰이기도 했고, 잘못 쓰면 시대착오적이 되기 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2023년에 다시 보는, 아주 잘 만든 '소년에서 남자로'라는 테마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그것이 '아버지로부터의 전승'이 아니라는 점이 에디터에게는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소년이 혼자 남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과정에서 돌봄과 지켜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설득력을 더합니다. '마초'로서의 남자가 아니라, 성숙하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남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앞서 말했듯, 이런 테마는 잘못하면 시대착오인 신파가 되기 쉽습니다. 각본에 감독까지 맡은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어떤 고민을 했을지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테마에서 드러났다고, 에디터는 생각합니다.
4) 모두의 애정과 경험
영화관에서 가장 많이 든 생각 중 하나는 '아, 이노우에는 이 작품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였습니다. 그 애정이 듬뿍 느껴진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원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코트 위의 다섯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뛰는 목적이 되는 순간들에 대한 존중도 드러납니다. 이건 이노우에가 가지고 있는 농구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이겠죠.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애정과 열정이 느껴지는 작품인데, 디테일 하나하나도 살아있습니다. 강백호가 부상을 당한 이후 걸음걸이를 보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가 느껴진다거나, 모두에게 감동을 준 대사들을 들을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일이죠. 에디터가 볼 때, 뒤에 계신 분은 정대만이 "말해 봐, 내 이름이 뭐지?"라고 묻자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정대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애정이 끈끈하게 연결된 마스터피스만이 해낼 수 있는 장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에디터의 앞자리에는 나이 지긋한 노신사분과 아들로 보이는 청년이 즐겁게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이죠. 만화가 가진 힘. 그냥 만화가 아니라, 아주 잘 만든 만화가 가지는 힘일 겁니다.
웹툰을 본진으로 하지만, 고향같은 작품은 <슬램덩크>인 에디터니까, 웹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슬램덩크>는 말하자면 소년점프의 황금기 끝자락을 장식한 작품입니다. 데즈카 오사무의 시대를 지나온 소년점프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 등장할 수 있었던 작품인 셈이죠. 그때의 일본 만화산업만 해도 역사가 깁니다. 소년점프 창간이 1968년이니까, 그때만 기준으로 잡아도 <슬램덩크>의 연재는 22년째인 1990년에 시작됐습니다.
'마스터피스'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탄탄해야 합니다. 서로의 색깔이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문화가 필요하죠. 그렇게 바닥을 단단히 다져야 딛고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까지의 웹툰이었다고 에디터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슬램덩크> 같은 감동을 줄 웹툰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요. 다만 아직까지 웹툰의 '영광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게 되네요. 물론, "더 세컨드" 슬램덩크도 기대하게 됩니다.